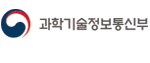뉴스센터
뉴스센터
같은 영화를 보고 더 잘 기억하는 이유, ‘해마’로 밝혔다- IBS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자기공명영상(fMRI) 활용해 해마의 기억 조율자 역할 규명 - - 기억 형성·회상에 대한 신경과학적 이해를 확장하는 중요 계기 마련 - 우리의 뇌는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다양한 정보를 동시에 받아들이며 기억을 형성한다. 특히, 등장인물의 이름, 관계 변화, 사건의 흐름 등을 통합적으로 기억해야 나중에 내용을 잘 회상할 수 있다. 이처럼 새로운 정보 처리, 기억 형성 그리고 회상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우리 뇌 속 해마(hippocampus) 어떻게 통합적으로 조율하는지 비밀이 밝혀졌다. 기초과학연구원(IBS, 원장 노도영) 뇌과학 이미징 연구단 심원목 참여교수(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부교수)와 유승범 참여교수(성균관대 글로벌바이오메디컬공학과 조교수) 공동연구팀은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RI, fMRI)1)을 활용해 해마가 기억 형성과 회상에 관여하는 여러 인지 과정을 조율하는 메커니즘을 규명했다.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유튜브 웹드라마를 보여준 후, 자유롭게 줄거리를 회상하게 하면서 뇌 신호를 측정했다. 웹드라마는 대학생들의 연애와 우정 이야기를 다루며, 삼각관계와 이별 같은 다양한 갈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실험 결과, 새로운 정보가 적은 장면일수록 참가자들이 더 잘 기억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새로운 정보를 감지하는 과정과 기억 형성 과정이 연관되어 있음을 암시한다. fMRI 데이터 분석 결과, 해마는 영화 장면마다 새로운 정보 처리, 기억 형성 그리고 기억 회상 과정을 처리하며 이 일련의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연구팀은, 해마의 조율 역할을 중심으로 fMRI 데이터를 분석했다. 해마의 신경 신호를 분석해 각 인지 과정의 핵심 신경 신호 축인 ‘기억 형성 공간’, ‘기억 회상 공간’, 그리고 ‘새로운 정보 처리 공간’을 추출하여 분석했다. 이 공간들은 뇌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신경 신호를 단순화해 특정 기억 과정이나 정보 처리 과정을 설명하는 핵심 신호 축인 저차원 하위 공간(low-dimensional subspace)'을 의미한다. 그 결과,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과 기억 형성 공간은 신경 활동이 특정 축을 따라 조율·정렬되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정렬’은 신경 신호 패턴이 서로 유사하게 배치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해마가 새로운 정보를 처리한 뒤 이를 기억 형성과 통합하는 것을 돕는다는 점을 보여줬다. 반면, 기억 회상 공간은 기억 형성 공간과만 정렬되어 있었고,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공간과는 정렬되지 않음을 확인했다. 더하여, 새로운 정보 처리 공간과 기억 형성 공간의 정렬이 더 잘 이루어진 참가자일수록 이후 영화 내용을 더 잘 기억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이는 해마가 기억을 형성할 때 신경 신호 패턴이 얼마나 잘 조율·정렬하는지가 기억력을 높이는 중요한 열쇠라는 점을 보여준다. 유승범 참여교수는 “해마의 개별 인지 과정에서의 역할 뿐 아니라 여러 인지 과정을 조율하는 역할을 규명한 중요한 연구”라고 전했다. 심원목 참여교수는 “자연스러운 경험 속에서 뇌 활성화 패턴을 분석해 기억 형성과 회상 과정을 조율하는 해마의 메커니즘을 밝힌 혁신적 연구”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Nature Communications)’에 1월 14일 온라인 게재됐다. 그림 설명
[그림1] 기억 과정과 관련된 해마의 하위 공간 간 정렬
[그림2] 해마의 고유 성분과 하위 공간 성분의 비교 1) 기능적 자기공명영상(functional MRI, fMRI): 뇌 활동을 시각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비침습적 영상 기술이다. 이 기술은 뇌의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혈류 변화를 측정하여, 해당 영역의 신경 활동을 간접적으로 추적한다. |
| 다음 | |
|---|---|
| 이전 |
- 콘텐츠담당자
- 홍보팀 : 나희정 042-878-8155
- 최종수정일 2023-11-28 14:20











![[그림1] 기억 과정과 관련된 해마의 하위 공간 간 정렬](https://www.ibs.re.kr/dext5data/2025/02/20250203_110220619_62993.png)
![[그림2] 해마의 고유 성분과 하위 공간 성분의 비교](https://www.ibs.re.kr/dext5data/2025/02/20250203_110243871_01710.png)